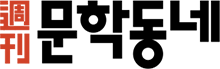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이해해보려는 노력이 소설이라고 말하는 것은 멋있기보다 위험한 일이다. 이해라는 손톱만큼의 빛을 위해 자신의 대부분을 어둠에 내주어야 하는 작업이기에. 초승달을 얻으려 얼굴의 대부분이 컴컴해지는 지구별처럼. 문자 그대로 understand는 이해해보려는 대상보다 아래에 서보는 일. 무작정 아래에 서다보면 이해는커녕 시야에서 사라져버릴 수도 있으니. 얼마나 먼 은하계에 있는지, 빛이 도달한 지금까지 건재한지조차 알 수 없는 밤하늘의 희미한 별들처럼.
지구 자전 방향으로 산책하는 모두를 거스르던(달밤에 선글라스까지 끼고) 한 사람을 이해해보겠다며 자판과 씨름한 몇 달, 영감의 발원지인 아파트 단지 조깅 트랙을 밤마다 한 시간씩 돌았다. 뮤즈가 되어준 그를 다시 볼 수 있을까, 캐릭터 묘사에 힌트라도 얻을까 기대했지만 그림자도 비치지 않은 그였다. 한번은 어제와 다른 모양의 달 아래를 뱅글뱅글 돌다 흠칫한 적도 있었다. 다른 사람들을 거슬러 반자전 방향으로 돌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것이다.
선글라스 사내에게 빙의돼버렸던 걸까. 등장인물에게 몸뚱이를 빼앗겼다는 혼자만의 농담이 그냥 농담만은 아니었던 걸까. 어쩌면 내 안에는 원래 그런 존재가, 시간과 공간과 그 모두를 거스르려는 존재가 도사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너무 가까워 시시각각 모양이 달라지는 저 달처럼. 아니, 발 딛고 있어 대기권 밖으로 벗어나기 전에는 결코 볼 수 없는 지구별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누군가는 결국 우리 자신의 일부인지 모른다.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민낯이 드러나는 쪽은 가면 아래 숨은 얼굴만이 아니다. 가면이 벗겨진 자리에는 거울이 남기 마련이기에.
제목부터 문장부호까지 작가의 근시안을 환히 밝혀준 편집자 이상술님과 스크롤의 압박에도 여기까지 동행해준 독자 여러분(한 분일지 두 분일지 여러 분일지 모르겠지만) 고맙습니다. 책상 앞에서 달아나려 발버둥치는 몸과 마음을 번번이 되돌릴 수 있었던 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 챕터 제목을 클릭했을 당신이었습니다.
2020년 12월
김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