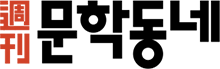소설을 쓰면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 중의 하나는 내가 있을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집이 생겨나는데 나는 이미 그것에 익숙해져 있다. 그렇다면 집을 짓는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는데 소설을 쓰지 않으면 집이 생겨나지 않으니 내가 신경쓰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짓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내 경험으로는 대체로 장편소설에서 가능한 일 같다. 장편소설을 쓰다보면 어느 순간 집이 생겨나고 이미 나는 그곳에 있는 것이다. 이 소설은 소설 내부에서도 집이 생겨난다. 그런 지점에서도 쓰는 동안 재미를 느꼈다.
가끔 잠이 안 오면 어떤 방이 있고 나는 그곳에 매트리스를 놓고 거기에 누워 또 무엇을 놓을 것인지 생각해보다가 잠이 든다. 그럴 때 이미 잊은 것 같았던 십 몇 년 전 여행에서 묵었던 방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서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너도 어딘가 누워 있겠지, 장편을 쓰며 내가 지낼 수 있던 방과 집을 떠올리고 거기에 이미 나라고 하기 힘든 나의 일부가 포함된 어떤 사람이 누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방에 무엇을 갖다놓을 수 있을까. 책이 너무 많으면 답답할 것 같다. 테이블과 전기 포트와 컵이 있으면 좋겠다.
열흘쯤 전에는 자기 전에 문득 누군가 한 명 정도는 즐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 소설을 읽은 누군가가 즐거웠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내가 구체적으로 느끼는 즐거움이란 마구 걷는 것 그러다 지나가며 보는 건물에서 어떤 방을 떠올리는 것이다. 지금까지 소설을 쓰면서 그런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구체적인 한 문장으로 떠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 아무튼 즐거워진 사람은 그러다 계단을 오르고 문을 두드릴지 모르고 두드리지 않아도 이미 두드렸는데 그럴 때 문 너머에서 누워 있던 사람은 몸을 일으켜 물을 끓인다.
소설을 쓰고 연재를 하는 동안 부산에 집을 구해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가끔 했는데 매번 꼭 그렇게 되어버릴 것만 같아서 그 순간은 긴장이 되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소설처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착각에 빠지기가 쉽고 그런 착각은 참 즐겁고 그래서 같이 춤추기도 하지만 이미 소설은 냉정하게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물론 알아. 나도 잘 알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다보면 아무튼 괜찮다는 생각이 잠깐 든다. 그런 식으로 또 그러다가 다른 방식으로 앞으로도 여러 곳에 가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