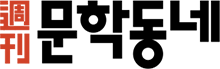황선우의 말
1년 동안은 ‘편지 쓰는 사람’으로 살았다. 다른 글도 쓰면서 지냈고, 글쓰는 것 외에 다른 일을 더 많이 했으며, 편지를 쓰는 날은 한 달 중 며칠뿐이었는데도 이상하게 지난 1년은 그 상태로 지냈던 기억이다. 혼비씨, 하고 띄우는 운은 참 신기해서 그렇게 문장을 열면 딱히 글이 되지 못할 것 같던 사소한 일화나 휘발될 감정들도 편안하게 적어내려갈 수 있었다. 겪으면서 재미났던 일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하며 혼비씨를 웃기고 싶어 일부러 기억해두었고, 겪을 때는 고약했던 일들도 편지에 써서 혼비씨에게 종알종알 일러바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웃고 넘길 수 있었다. 소식을 띄워 보내고 답장을 기다렸다가 기쁘게 받아 열어보는 일이 한 달에 한 번씩이니 시간의 흐름이 더 명료하게 느껴졌다. 여러 통의 편지가 쌓이는 동안 계절이 몇 번 바뀌었다.
다만 즐거운 일들을 주로 쓰자고 마음먹었는데 꼭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우리가 편지를 주고받는 사이 편지 저편 ‘혼비씨’가 앉아 있는 배경에서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고 꽃이 피었다가 졌다. 시간이 사람에게 하는 일이 그사이 어김없이 우리에게도 일어났다. 풍경 사이로 끊임없이 일상의 피로를,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늙음과 죽음을, 죽은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흘려보내는 것 말이다. 누구나 마음속에 태풍을 안고서 잔잔하게 살아가듯 그 모두를 품고도 되도록 명랑한 소식을 전하려 애썼지만 실패하기도 했던 것 같다. 그럼에도 스스로를 덜 검열하고 덜 재촉했던 건 모니터 저편에서 기다릴 수신인의 존재 덕분이었다. 무엇을 써 보내더라도 사려 깊게 읽어줄 혼비씨가 있어서였다. 편지 쓰는 사람은, 편지를 기다리는 사람을 떠올리면 더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
우리의 1년이 끝났는데도 나는 자꾸만 혼비씨, 하고 말을 걸고 싶어진다.
2023년 5월
황선우
김혼비의 말
세상에 쉽게 쓸 수 있는 글이란 없지만, 내가 유독 쓰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종류의 글이 있는데 그중 1등은 단연 편지이다. 어느 정도냐면, 받기만 하는 처지에 놓이느니 차라리 주기만 하는 처지에 놓이는 게 마음이 훨씬 편할 만큼 전자의 상황을 극도로 두려워하며 기를 쓰고 피하는 내가 편지에 있어서만은 받기‘만’ 하는 뻔뻔한 사람으로 20년 넘게 살아왔다. 살면서 그 흔한(?) 연애편지 한 번 써본 적 없고, 연애편지에 답장을 써본 적도 없으며, 가끔 연인이나 친구들이 (내가 하도 답장을 안 쓰니까 희귀템을 모으는 느낌으로) 편지를 요구하면 “제발 그것만은…… 내가 다른 걸로 진짜 잘할게. 뭐 필요한 거 없어?”라고 읍소하곤 했다. 그런 내가 이렇게 여섯 통의 편지를 쓰다니 놀라운 일이다. (몇몇 친구들은 “이야, 너한테 편지를 받으려면 계약을 해야 하는 거구나?”라고 마구 놀렸는데 맙소사, 나는 정말 자본주의의 쓰레기다……)
더 놀라운 것은 초반에는 (목탁이 필요할 정도로) 조금 헤맸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편지 쓰는 일이 정말 즐거워졌다는 것이다. 이래서 편지를 쓰는구나. 다들 이런 마음으로 썼겠구나. 편지를 쓴다는 것은, 쓰는 동안만이 아니라 쓰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편지를 받을 상대방을 계속 생각하게 되는 일이라는 걸 이번에(이제서야!) 알았고, 떠올릴 때마다 웃음과 기운이 나는 사람을 자주 생각하는 게 얼마나 삶을 즐거운 방향으로 이끄는지를 새삼 온 마음으로 느낀 1년 남짓의 여정이었다. (작가님이 이끌어준 여러 ‘즐거운 방향’ 중 일부를 자세히 적은 나의 열번째 편지―아직 <주간 문학동네>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마지막 편지―를 읽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즐거운 여정이었는지 좀더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이 모든 걸 경험하고 알 수 있게 해준 황선우 작가님께 정말 감사하다. ‘당연히 최선을 다하겠지만 죽을 만큼 최선을 다하지는 않는 것’을 실현하는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 그중 ‘함께 나눠서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꼭 물리적인 몫의 나눔이 아니더라도 함께 꾸준히 일상을, 웃음을, 마음을 나누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앞으로도 잊지 않으려고 한다.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2023년 5월
김혼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