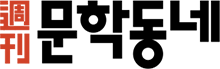“우린 정말 하와이에서 만나 제사를 지내야 해.”
엄마가 자주 하시던 농담이다. 엄마의 형제들은 언제나 한두 사람쯤 북미나 중남미에 있었으므로 그럴듯했다. 한 번도 실천에 옮긴 적은 없는데, 소설에서 해보고 싶었다. 가족의 농담 하나를 빌리고 비극 하나도 빌렸다. 한국전쟁중에 국군의 손에 돌아가신 작은할아버지가 계시다. 그 죽음이 만약 적군에 의한 것이었다면 이토록 오래 곱씹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이제 그 작은할아버지보다 열다섯 살쯤 많다는 게 신기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 비극을 소설 속에서 민간인 학살로 바꾼 것은 현재 많은 민간인 학살지들이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발굴되지 않고 개발지역에 포함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기억하지 않고 나아가는 공동체는 있을 수 없다고 믿는다.
이 소설은 무엇보다 20세기를 살아낸 여자들에게 바치는 21세기의 사랑이다. 심시선의 이름은 돌아가신 할머니의 이름을 한 글자 바꾼 것인데, 할머니가 가질 수 없었던 삶을 소설로나마 드리고자 했다. 나의 계보에 대해 종종 생각한다. 그것이 김동인이나 이상에게 있지 않고 김명순이나 나혜석에게 있음을 깨닫는 몇 년이었다. 만약 혹독한 지난 세기를 누볐던 여성 예술가가 죽지 않고 끈질기게 살아남아 일가를 이루었다면 어땠을지 상상해보고 싶었다. 쉽지 않았을 해피엔딩을 말이다. 또 예술계 내 권력의 작동 방식에 대한 소설이기도 하다. 단순하게 그리기 위해 배경을 뒤셀도르프로 옮겼다. 혹 뒤셀도르프에 연고가 있는 분들이 슬퍼할까봐 해명하자면, 한 사람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유럽의 작은 도시이면 어디든 상관없었다. 뒤셀도르프가 미술의 도시이고 수로가 아름답기에 골랐을 뿐이다. 이미정 개인전 <The Gold Terrace>, ORGD의 2019년 전시 <모란과 게>, 전태일기념관 기획전 <시다의 꿈> 등 시각예술 전시에 참여했던 것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관여하는 감각이 다른 장르가 어떻게 교차되는지 다시 못할 경험을 했다. 더하여 한국 사회를 감아도는 따가운 혐오의 공기에 대한 긴 토로이기도 하고,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국주의와 생태주의에 닿아 있는 부분도 적지 않고, 여느 때처럼 친밀감과 이해를 향해 썼다. 소설을 쓰면 쓸수록 나는 열심히 숨기고, 독자분들은 가끔 내가 숨기지 않은 것도 발견해가시는 것 같다. 변함없이 즐거운 보물찾기다.
마지막으로 직업과 관련하여 인터뷰를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전하고 싶지만 혹 누가 될까 소중한 이름들을 가려두고자 한다.
농담 하나, 비극 하나에서 출발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여과해낸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즐겁게 읽으셨길 바란다. 존재한 적 없었던 심시선처럼 죽는 날까지 쓰겠다.
2020년 여름
정세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