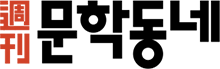신호등 하나 겨우 건너 뒷산을 오르내리던 산책이 요즘은 아파트 단지 내 조깅 트랙을 뱅글뱅글 도는 것으로 바뀌었다. 다람쥐 쳇바퀴 같던 일상이 문자 그대로 현실이 된 것이다. 마스크를 벗고 활보할 공간이 지척에 있는 것만도 어디냐며 감사해왔는데, 어느 날 복병이 나타났다.
가릴 빛이라곤 가로등뿐인 야밤에 새까만 보잉 선글라스를 벗지 않고 걷는 노인. 지구 자전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도는 모두를 거스르는 한 사람. 마스크도 없이 부딪칠(두 사람이 겨우 지나갈 만큼 폭이 좁다) 듯 다가와, 턱에 걸친 마스크를 쭈뼛쭈뼛 끌어올리게 만드는 한 사람.
게다가 왜 그토록 무시무시한 스피드로 걷는 것인지. 거칠게 내뱉는 숨소리에서 놓여나기 무섭게, 반 바퀴도 채 못 가 다시 마주치곤 했다.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이들의 표정은 짙은 어둠 속에서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지만, 달랑 눈빛만 가린 이의 표정은 환한 가로등 밑에서도 가늠하기 어려웠다.
그런 그가 트랙에서 자취를 감추고 며칠 뒤였다. 스치듯 그와 엇갈리던 순간을 복기하며 운동화를 꿰고 있는 자신을, 시간과 공간과 그 모든 걸 거스르는 어떤 인물에 대해 상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것은. 불가해한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게 마스크의 일이라면, 소설의 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조차 어떻게든 이해해보려는 노력일 테니까.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은 허구다. 현실세계의 어느 일단이 겹쳐진다면, 작가의 상상력 빈곤 때문임을 앞당겨 밝혀둔다.
소설 제목은 T. S. 엘리엇의 시 “The Hollow Men”에서 빌려왔다. 시에 인용된 주기도문의 우리말 표현은 윤혜준의 번역(『사중주 네 편』, 문학과지성사)을 따랐다.
2020년 8월
김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