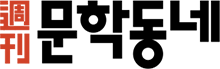제 힘으로 울기. 거기서부터 세계의 진입이다.
첫 울음의 사유는 슬픔이 아니었다.
짐승일기가 짐승울기가 되었다는 한 친구의 감상에 꼬리를 달고 울음에 대해 생각했다.
‘우리는 결국 왜 우는가’에 ‘왜 끝내 울지 못하는가’가 들어 있을지 몰라.
강한 포식자들은 자주 울지 않는다. 과묵한 공격자들이 가끔 행하는 울음은 그 자체가 강력하고 날이 서 있고 파장이 크다. 못 우는 게 아니라 안 우는 거니까. 내가 좋아하는 코끼리의 울음은 5km 밖 동료들에게도 닿는다. 저주파를 이용해서 선명하고 날카롭다. 짐승들은 왜 우는가. 배고파서 운다. 위협하고 경고하려고 운다. 기뻐서 울고, 공포를 느껴 울고, 구애하느라 운다. 자기 목소리를 그냥 들어보려고 울기도 한다. 나 여기 있다고, 너는 어디에 있냐고 운다. 나는 그들이 무료해서 울기도 한다는 사실이 좋다. 우는 법을 잊은 짐승이 인간이 된다. 울음보다 말이 많은 인간이.
이 글이 공개되는 시간에 나는 수술실에 있을 것이다. 이름 모를 기계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겠다. 조금 춥고, 나쁜 상상을 밀어내느라 주먹부터 온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겠다. 오백 원짜리 동전 크기의 케모포트가 제거되고 잠시 후 살이 타는 냄새가 나겠다. 심장과 뼈에 대해 생각하겠다. 벤 로렌스 감독이었나. 동명의 그 영화는 어떻게 끝이 나더라. 무언가가 영영 사라졌던 것 같은데. 지난 오 개월 동안 짐승의 울음과 인간의 말을 이어주던 케모포트가 몸에서 사라진다. 전부터 궁금했다. 내가 잃게 될 건 울음일까 말일까.
곤히 잠든 숨의 동료들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화장실에서 이 글을 쓴다. 병원에서 제일 쓸쓸한 공간이다. 세면대 너비의 큰 거울 때문일 거다. 아픈 몸을 직시할 때. 양치질과 세수를 하는 손이 너무 느리고 서툴 때. 마스크를 먼저, 다음에 모자까지 벗은 모습을 비추는 거울에 언뜻 내가 없을 때. 내가 기억하는 얼굴이 거울 속에서 사실도 진실도 아닌 이상하게 부푼 세계의 일원으로 씩씩할 때 쓸쓸하다. 연재 글을 쓰는 동안 울거나 울컥한 적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없다, 라고 간명하게 대답한 적이 있다. 겨우 쓰고 이내 잊었다. 화장실에서 이 마지막인 글을 쓰면서는 내 힘으로 좀 울었다. 나 여기 있다 넌 어디 있냐, 하고 제 힘으로 울기. 아직 살아보지 못한 생이 시작될 참이다. 그건 또다른 짐승‘들’의 시간이겠다.
말보다 울음 많은 이들 덕분에 썼고, 행복했다. 그들에게 깊고 긴 포옹을 전하고 싶다. 어느 날 내게 온 하얀 고양이 사샤에게도. 우리는 매주 잠시 서로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