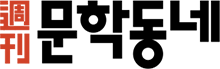어느 날 아버지가 라디오 하나를 택배로 받았다. 설명서를 읽어도 사용 방법을 알 수 없던 그 라디오를, 우리 가족은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만져보았고, 안테나라고 명시되어 있는 고불고불한 전선을 라디오의 몸체에 칭칭 감아본 후에야 겨우 주파수를 맞출 수 있었다.
전원 버튼을 누르면 라디오가 흘러나왔다. 전원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라디오가 흘러나왔다. 어느 요일이라 정한 것 없이, 라디오는 열시 정각이면 갑자기 켜졌다. 부드러운 선율이 흐르기도 의미심장한 가사가 흐르기도 했다. 미리 볼륨을 줄여놓았는데도 약간은 귀에 거슬리는 음량으로 되돌아가, 나 라디오님이 지금 켜졌는데! 알리듯 그렇게 저 혼자 켜졌다.
오전 열시에 나는 대체로 컴퓨터 앞에 앉아 소설을 쓰고 있었다. 조용한 가운데 스스로 켜지는 라디오 소리를 듣고 처음에는 기겁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다. 알 수 없는 원리로 열시만 되면 각양각색의 소리를 울리는 라디오, 도대체 무엇을 노래하고 싶어 자꾸만 스스로 켜지는 걸까.
전원을 뽑아버리면 그만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했는데도 라디오가 켜질까 무서워 그대로 두었다. 이해할 수 없는 채 놓아두고 하루하루 잘도 지나왔다.
몇 달이 지나서야 아버지에게 라디오가 열시마다 저절로 켜진다 보고했다. 아버지는 그 시간이면 늘 집에 계시지 않았고, 내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기에,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마치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 같네.
그 말을 듣자 모든 기이함이 소설이란 단어 속으로 빨려들어왔다. 믿을 수도 없고 믿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은 소설이 되는 걸까? 나 역시 라디오와 관련된 일들이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이어서 나는 기이한 맥락 속에서 연결되는 소설을, 한쪽의 믿음을 선택하면 다른 한쪽의 믿음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써보고 싶어졌다.
어쨌거나 혼자 모니터 앞에 멍하니 앉아 있으면 외로워 보일 테고, 실제로 체력의 소진을 느낄 만큼 지속적인 고독이 따르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를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내내 읽어줄 사람들이 어딘가 있을 거라는 확고한 예감이 찾아든 덕분일까. 연재란 이런 것이구나 싶고 두 계절 정도의 평화를 가불해 받은 것 같다.
가능하다면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가보고 싶다. 물론 홀로 켜지고 마는 라디오도 함께 간다.
2023년 8월
김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