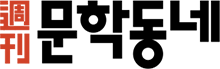“나만 없어, 돌 사진.”
차녀 친구들과 모이면 하이파이브를 한다. 야 너도? 야 나도!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인구주택총조사처럼 전국의 차녀들에게 설문을 돌리고 싶다. ‘당신에겐 돌 사진이 있습니까?’ 그리고 뜨거운 포옹을 하고 싶다. 유 어 낫 얼론. 베이비 돈 크라이. 누군가는 그깟 돌 사진이 뭐가 중요하냐고 물을 것이다. 어른이 되어서까지 생후 1년째 되던 날의 사진 유무에 집착하는 게 썩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돌 사진은 그냥 사진이 아니다. 가져보지 못한 자에게 그것은, 나라는 존재가 양육자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증표다. 사진은 특별한 날 카메라를 지참해서 찍고, 사진관에 가서 인화하는 수고를 거쳐야 가질 수 있었던 80, 90년대생, 정부의 적극적인 산아제한 정책으로 자녀를 평균 두 명, 많아야 세 명 정도 낳던 시절의 ‘또’ 딸인 둘째는 어느 날 한껏 멋을 낸 부모와 아직 작은 베개만한 언니가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을 보다가 해맑게 묻는다.
“내 사진은?”
그리고 하나의 진실을 마주한다.
없단다.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이사하면서 잃어버리지도,
집에 도둑이 들어 훔쳐가지도 않았는데 처음부터 내 돌 사진은 ‘그냥’ 없는 거였다. 이럴 수가…… 허망한
눈동자로 사진을 들여다본다. 사진에는 그날의 분위기가 담긴다. 조명, 온도, 습도, 어딘가
낯선 젊은 부모의 얼굴과, 품에 안은 아기를 지그시 바라보는 애정어린 눈빛 같은 것들. 첫아이의 첫 생일이라니, 얼마나 특별하고 가슴 벅찼을지 굳이 상상할
필요도 없다. 아이를 낳지 않은 나도, 처음 구워본 밥통
치즈 케이크 앞에서 360도 빙빙 돌며 사진을 찍어댔으니까. 얼마
전 나의 언니는 엄마가 되었다. 목을 가누기 시작하는 조카를 안고 나에게 다가오는 언니를 보며 나는
소리쳤다. “세상에, 언니 백일 때랑 얼굴이 똑같네!” 언니가 아기와 얼굴을 맞대며 웃었다. 언니보다 1년 7개월 늦게 태어난 내가 어떻게 언니의 백일 때 얼굴을 알고
있을까? 답은 간단하다. 언니의 백일 사진을 봤기 때문이다. 우리집 가족 앨범의 오프닝은 언제나 그 사진이었다. 나는 대충 서너
살쯤 되어서야 앨범에 등장한다. 감나무 집 손녀답게 그쯤 자란 애를 나무에서 따온 줄 알았다.
이런 현상은 제법 보편적인 듯하다. 스무 살의 어느 날, 영어 과제를 하다가 ‘middle child’, 즉 형제자매 중
가운데 순서인 아이가 주제인 칼럼을 읽은 적 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해석될 때마다 나의 심금을 울렸다. 가운데 아이는 출생 순서상 집에서 배제되거나 무시되거나 방치될 가능성이 높기에 집에서 사진도 가장 적고, 양육자가 그들의 특성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내용이었다. 이걸 중간
아이 콤플렉스middle child syndrome라고도 하더라.
무시나 방치까지는 아니더라도 돌 사진의 유무는 말해준다. 나의 첫돌은
언니의 첫 생일만큼 새삼스럽지도 기념할 만한 날도 아니었다고. 나는 이번 생이 처음인데, 부모는 내가 처음이 아니다. 감흥이 덜할 수밖에 없다. 나름대로 사랑받으며 자랐고 서른을 훌쩍 넘은 지금에야 낄낄 웃으면서 말하지만,
어릴 때는 그게 그렇게나 서러웠다. 나만 돌 사진 없어.
농경사회에서 우르르 뒤엉켜 크면 사진 따위 알 게 뭐야 싶지만, 둘 혹은 셋 중에서 ‘나만’ 없는 건 다른 문제다. 심지어
저는 네 명 중에 저만 없거든요. 돌 사진 없는 거 보니 돌잔치도
안 한 거 아니냐고 눈을 부라리면, 아니라면서 너도 집에서 돌잔치 했다고, 연필 집었다고 해명한 것도 다 수상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거짓말
같다. 콱 압수수색할까보다.
차녀는 집 안팎에서 무수한 신호를 수신한다. 너는 이 집에서 ‘두번째’고, 아들이 아니라서
네 의지와 무관하게 여러 영역에 걸쳐 ‘잉여’로 해석될 것이며, 자연스럽게 말석을 배당받을 거라는 메시지. 순서로도 성별로도 두번째인
차녀는 덤 취급을 피하기 어렵다. 그래서 작은 차이에도 민감하다. 당연하게
제 몫이 보장되는 첫째와 달리, 끊임없이 남의 그릇을 힐끔거린다.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인정받고 싶어한다. 이러한 감정은 첫째의 부담감이나 책임감과는 또다른 형태로 발현된다.
유교 국가에서 맏딸로 사는 애환은 최근 웹상에서 꽤 화제가 되었다. ‘K-장녀’라는 유행어, <문명특급>의
재재와 야니가 부른 <유교걸> 등이 많은 이들을
웃기고 울렸다. 개인의 성격 형성에는 많은 요소가 기여하는데, 이중
출생 순서에 따른 역할 부담이나 책임감, 부모와의 관계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장녀가 살림 밑천, 장남이 집안의 적장자라는 이름 아래 고통받는다면
차녀는…… 글쎄, 세상은 차녀에게 별 관심이 없다. 셋째 딸은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다는 말이라도 있지. 첫째가 자신에게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 때문에 중압감을 느낀다면 차녀는 어둠 속에서 대사 한 줄이라도 더 얻어보려고 발버둥치는 무명배우 같다. 밑에 동생까지 딸린 중녀라면, 나를 봐달라고 북 치고 장구 치고
꽹과리 치며 상모를 돌려야 눈길 좀 받을까 말까다. 당연하게도 차녀가 더 힘들다는 식의 불행 배틀을
하려는 게 아니다. (아, 나 또 중립 지키려고 쿠션 까네. 이것도 차녀 특성이라고 혼자 우기는 중.) 세상 모든 인간은 제
몫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간다. 다만 둘째 자녀의 경험과 감정, 그
조금 특별하고 치열한 세계에 관한 이야기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할 뿐이다.
일반화의 위험은 있다. 집안 분위기나 환경은 다 다르고, 자식이 각양각색이듯 부모 역시 십인십색이니까. 게다가 4인으로 이루어진 ‘정상가족’에
제한될 수 있다는 한계도 뚜렷하다. 차차 이야기하겠지만 ‘어떤’ 차녀인가에 따라 경험과 입지 또한 천차만별이다. 위에 언니가 있는가, 오빠가 있는가, 언니와 여동생이 있는 중녀인가, 언니와 남동생이 있는 낀 딸인가…… 어떤 조합이든, 공통점은 차녀는 센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오빠가 있다면 집안의
귀여운 액세서리거나 오빠 뒤치다꺼리를 해줄 솔거노비(주로 어릴 때부터 라면을 끓이기 시작한다), 언니가 있다면 실망스러운 ‘또’
딸(동성의, 나보다 모든 면에서 한발 앞선 경쟁자와
자라며 생긴 새 옷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다), 낀 딸이라면 장녀와 장남(남동생 있는 장녀들은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의 남동생은 둘째가 아니라
장남입니다) 사이에 낀 새우등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뚫고 감히 ‘차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이유는 한 가지다.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여겨졌던 ‘잉여’의 경험 때문에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내면에 서러운 여자아이가 울고 있는 친구들에게, 말을 걸고 싶어서.
나는 낀 딸이다. 위로는 연년생 언니가 있고 밑으로는 나이 차이가
열네 살, 열다섯 살씩 나는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다. 딸을
낳는 게 '아들'을 낳기 위한 여정이었던 시대적 맥락 속에서
나는 오랫동안 내가 잘못 태어난 게 아닌지, 부모님이 나를 실패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이 집에서 나는 어떤 역할인지 고민하고 괴로워했다. 언니는 첫째고
셋째는 늦둥이며 막내는 막둥이이자 장남이다. 나? 나는…… 시끄러운 애? 4인조 그룹에 머릿수 맞추려고 들어간 사람처럼 캐릭터가
없고 존재감이 희미하니 어른들이 나를 특별히 여길 명분이라고는 없다고 생각했다. 당시로서는 드물게 ‘딸 바보’ 소리를 듣는 양육자 밑에서 컸음에도 말이다. 왜 나는 열 살도 되기 전에 나의 출생이 실망을 동반했다는 것을 알았을까? 왜
열심히 해서 뭔가를 성취해낼 때마다 고추 타령이나 들어야 했을까? 왜
‘아들 낳으면 기차 타고 딸 낳으면 비행기 탄다’는 소리에 집착하며, 엄마 아빠에게 비행기 태워주겠다는 편지를 썼을까? 왜 내가 받은
모든 물건에서는 언니의 향기가 느껴졌을까? 어째서 나는 내가 딸이어서 엄마에게 미안하다는 감정에 시달릴까? 왜 엄마는 언니의 학부모 모임에만 가고, 아빠는 언니가 좋아하는
음식만 기억할까?
차녀들이여, 이제 우리가 MIC을
쥘 차례다. 소외된 차녀들 왼발을 한 보 앞으로.
때로는 유년 시절의 서러움을 나누고 유치할 만큼 서로 편들어주며, 때로는
언제나 ‘다음’ 순서여서 포기해야 했던 욕망을 어루만져주며, 우리가 나고 자란 배경을 샅샅이 파헤치고 분석하며, 출생 순서에
위계와 의무를 부과하여 아동을 고통에 빠뜨린 유교 사회를 디스하며 떠들어보련다. 힙합이 별건가? 한국 사회에서 딸로 사는, 마! 이게
바로 힙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