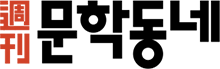아침에 눈을 떠 브렉퍼스트 메뉴를 생각한다. 홈스테이의 브렉퍼스트 메뉴는 정해져 있지만 오토바이를 끌고 가 밀림처럼 나무와 풀로 우거진 브런치 카페나 해변 옆 끈적거리는 테이블이 있는 레스토랑으로 가도 된다. 파도 소리, 곧 이어질 무더위의 예고편 같은 햇살에 눈을 찌푸리다 스크램블 에그, 빵 한 쪽, 이마에 밥풀을 붙인 종업원이 자기 방식대로 내린 라테에 그럭저럭 만족하며 아침식사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
흰 리넨 커튼을 걷고 유리문을 밀고 방에서 나오면 방과 정원은 이어져 있고, 오늘은 어떤 귀여운 동물 친구가 내게 걸어올까. 옆집 지붕 끝에서 울리는 작고 맑은 종소리가 마음 가장자리로 퍼져나간다.
이 평화가 믿기지 않는다. 나는 여길 어떻게 왔지?
정원 돌바닥을 따라 늘어선 작은 석등.
저녁이면 전기와 모든 불이 꺼지는 이 어촌 마을에서.
어둠에 잠기면 다시 새로운 생존에 대해 배워야 한다.
작은 뿌리나 줄기 같은 것이 어둠 속에서 끝없이 뻗어나간다. 불안이 내 실재처럼 느껴지는 순간, 호흡하고 되뇐다. 이 글들은 그 호흡과 연결되어 있다.
어떤 도시에도 어떤 인간관계에도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면서(그러나 제대로 연결되는 관계라는 건 내 판단에 불과하지 않은가) 들개처럼 불빛도 인적도 없는 거리를 쏘다녔다.
나는 무모함에 거의 모든 에너지를 썼다. 잘 꾸며진 광활한 랜드마크는 호기심이 일지 않았다. 인터넷에서도 정보를 얻기 어려운 곳만 골라 다녔다. 불확실한, 누구도 가보지 않은 자연, 모험이 심장을 뛰게 했다. 어떤 날은 등산로가 없는 산꼭대기, 어떤 날은 망망대해 한복판 카약에 홀로 있었다. 일부러 시련을 겪을 생각은 없었지만 어쩐지 매일 나의 생존력은 심판대에 올랐다.
집시나 히피와 다를 바 없었던 생활. 수백 개의 에피소드로 타임라인은 흩어지고 조각나고 채워진다. 내 덩치보다 큰 백팩을 짊어진 채 비행기도 버스도 놓친 날이 있었다. 포기하면 좋았을 텐데 포기가 안됐다.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도시에 내렸다. 구글 지도로 간신히 이곳이 내륙인지 바다 근처인지 가늠했다. 지도를 확대하면 온통 생소한 지명이다. 그마저도 드문드문 떨어져 있다. 칠흙같은 어둠을 뚫고 도로를 걸었다. 어둠 때문에 사실 이 근처에 바다나 항구가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커다란 야자수들이 음산하게 느껴졌다. 바람이 쎄게 불자 야자수는 거대한 그림자처럼 흔들렸다. 두려움이 흥분으로 바뀌어갔다. 통쾌하다…… 나와 세상의 경계가 뭉개진다. 차선으로 택한 낯선 도시에 홀로 남겨져서야 마침내 멈출 수 있었다. 의미를, 목적을, 생각하기를.
멀리 호텔 불빛이 보였다. 가면 된다. 그저 남은 힘으로 가면 된다.
밤거리 작은 식당에서 혼자 국수나 볶음밥 한 그릇을 먹고, 우연히 만난 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새로운 기억을 만들면, 그것이면 되었다.
때때로 버려진다는 두려움이 실존처럼 느껴진다. 익숙한 드라마가 펼쳐지면 인정해야 했다. 아 이 혼돈을, 불안을 더는 지혜를 발휘할 수 없을 때가 있구나. 다만 내 곁에 공기와 바람과 풀냄새가 떠돌고 있어.
지난 결핍의 틈으로 채워넣길 바라왔던 것들. 내 에고가 스스로 지치길 원했던 건지도 모른다. 혼돈의 밤이 끝나면 믿겨지지 않을 만큼 맑고 청량한 종소리가 울려퍼지는 아침이 온다는 걸, 이제 나는 정확히 알고 있다. 나의 미성숙의 밤을 더는 탓하거나 미워할 필요가 없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하려는 시간이 삶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것이 내가 다시 쓰고 있는 서사임을. 미지에 대한 멈출 수 없는 흥분과 포기의 순간에도 자주 내 고통을 염려하며 살았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고 염려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다. 내 영혼은 그곳을 떠나도 거기에 있었다. 그것의 진정한 자유를 빌며.
언젠가 무성한 풀과 나무들로 이루어진 카페에서 그 속으로 쏟아지는 빛줄기를 바라보며 독자들에 대해 생각했다.
나의 슬픔의 페허에서 기꺼이 함께하고 폐허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빛에 의지해 살던, 살아가지 못하던 독자들에게 이제 고통이 아니라 다른 것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게 더 많아졌다는 것을.
나를 집어삼킨 슬픔의 폐허 속에서 당신들이 어떤 것도 얻지 않길 바랬지만, 깨지고 부서진 것들을 맨발로 밟으며 그것이라도 황홀이라 믿고 매달려야 했던 시절. 그 폐허에서 위로 받던 날들도 당신들과 함께여서 즐거웠다고.
2024년 4월
주하림